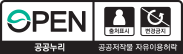대표 이미지 및 저작권 정보(N2L)
| 대표이미지 | 저작권정보 | ||
|---|---|---|---|
| 저작권자 | 국가유산진흥원 | ||
| 전자자원소장처 | 한국문화재재단 | ||
| 공공누리 저작권 | |||
|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3유형:출처표시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|
|||
| CCL 정보 | |||
| 소스코드 | <iframe width="720px" height="480px" src="http://uci.k-heritage.tv/resolver/I801:2108002-001-V00016?t=3" frameborder="0" allowfullscreen></iframe> | ||
관련 파일 및 자원정보(N2R)
| 번호 | 파일명 | 파일크기 | 다운로드 |
|---|---|---|---|
| 1 | 문화유산 e-클립뱅크_25편_백비, 나의 이름을 찾아서_CHF_1920X1080.mp4 | 67.25 MB |

|
콘텐츠 기본 정보(N2C)
| UCI | I801:2108002-001-V00016 | 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목 | 백비, 나의 이름을 찾아서 | ||||||||||||||||||
| 콘텐츠 유형 | 동영상 | 언어정보 | 국문 | ||||||||||||||||
| 생산자 정보 |
|
||||||||||||||||||
| 기여자 정보 |
|
||||||||||||||||||
| 기술 정보 |
|
||||||||||||||||||
| 관련 키워드 | 제주도;제주 4/3;백비 | ||||||||||||||||||
| 내용 | 1948년 4월 3일,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. 이후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집단 학살이 이뤄졌다. 제주 4.3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, 2003년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졌고 그 후 평화공원이 만들어 지고 기념관도 생기게 되었으며 이 유적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도 되새겨 볼 수가 있다. |
||||||||||||||||||
| 대본 정보 | 자막> 1949년 1월 12일, 제주도의 한 마을 고향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던 36살의 평범한 해녀 어느 날, 마을로 들이닥친 군경토벌대 이들의 총격으로 턱을 맞고 쓰러진 여인은 평생 그 상처 때문에 무명천을 얼굴에 두르고 살아야 했다 할머니의 이름은 ‘진아영’ 제주 4.3 사건의 희생자였다 자막>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무명천 할머니의 삶을 찾아가는 길 할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작은 집 이 조그만 공간에서 그 때의 상처로 사람들조차 만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세월 자막> 곱디고왔던 젊은 시절 당시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이 통치하고 있었다 자막>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에서 울린 총성 당시 3.1절 기념식을 마치고 거리고 나온 3만 여 명의 주민들 기마경관이 탄 말에 한 아이가 채이고 이를 무시하자 시작된 거센 항의 경찰은 습격으로 판단하고 무차별 발포를 시작 6명이 사망,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자막> 이후 7년 7개월 동안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자막> 그 숫자만 2만 5천 명에서 3만 여 명 생사조차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도 많이 있다 자막> 그러나 자막> 폭동 반란 자막> 아직까지 올바른 이름을 갖지 못한 제주 4.3 사건 자막> 그 이름 없는 역사의 아픔을 담은 제주 4.3 평화기념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당시 주민들의 숨어 지냈던 피난처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공포의 순간을 견뎌야 했던 주민들 자막> 그 동굴 끝 쪽에 조용히 누워 있는 커다란 백비 자막> 4·3 백비, 이름 짓지 못한 역사 자막> 왜, 이름 없는 백비일까? 왜, 백비는 세워지지 않고 누워 있을까? 자막> 제주 4.3 항쟁? 사건? 운동? 자막> 제주 4.3 사건은 어떤 이름의 역사이어야 할까 |
||||||||||||||||||